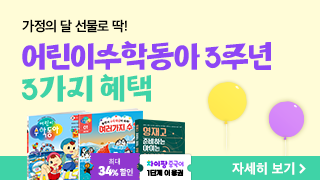벌써 50년이다. 1969년 7월 21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 전체에는 위대한 도약”이란 말로 감격을 대신했다. 이 말이 그가 우주에 가기 전부터 생각한 ‘준비된 멘트’인지, 갑자기 떠오른 센스 넘치는 말인지를 두고 몇 해 전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달 착륙은 지난 50년 동안 인류에게 꾸준히 감동을 준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달 착륙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프로농구(NBA) 간판 스타인 스테판 커리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류가 실제로 달에 착륙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해 음모론에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그러자 2009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호세 에르난데스 전 NASA 우주인은 “스테판 커리가 멍청한 음모론을 주도한다”며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다.
NASA도 커리를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스페이스센터에 초대해 달 착륙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커리가 약 이틀 만에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한 발 물러서며 사태는 진정됐지만, 달 착륙 음모론이 얼마나 흔히 퍼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처럼 1969년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은 50년 가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조작설이 처음 불거진 건 달 착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미국의 빌 케이싱이란 작가가 1976년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라는 책을 발표하며 나름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진실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자.
2002년에는 달 착륙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만든 바트 시브렐이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갔던 버즈 올드린과 논쟁을 벌여 화제가 됐다. 시브렐이 올드린에게 “성경에 손을 얹고 달에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자, 올드린은 분에 못 이겨 그의 뺨을 때렸다. 다행히 올드린이 기소 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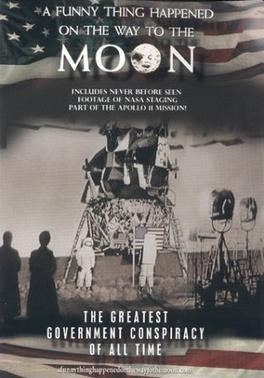
2009년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해 영국공학기술학회(IET)가 발행하는 ‘E&T 매거진’이 16~64세 영국인 10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25%가 달 착륙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게다가 응답자 100명 중 1명은 최초로 달에 간 인류가 버즈 라이트이어라고 적었다. 버즈 라이트이어는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우주비행사로, 버즈 올드린을 모델로 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달 착륙을 오랫동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달 착륙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1950~1960년대 미국과 옛 소련 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당시, 두 국가는 우주 탐사에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쟁을 했다.
경쟁에서 10년 가까이 우위를 선점하던 쪽은 옛 소련이었다.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고, 1961년 4월 12일에는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1965년에는 옛 소련 우주비행사가 최초로 우주유영을 해냈다. 1966년에는 최초로 무인 우주탐사선인 루나 9호를 달에 연착륙시켰다. 이런 식으로 1968년까지 우주 탐사와 관련한 인류 최초의 기록들은 대부분 옛 소련이 세웠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미국이 갑자기 반전시켰다. 옛 소련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1961년 사람을 10년 이내에 달에 착륙시키는 ‘아폴로 계획’을 세웠다. 아폴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한 것은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8년 뒤인 1969년 그 어려운 걸 아폴로 11호가 진짜로 해냈다. 동시에 달 착륙은 미국이 체제 선전의 일환으로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이제는 말하기 입 아플 정도지만, 인류는 정말로 달에 갔다 왔다. 음모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공기가 없는 달에서 성조기가 휘날렸다’는 의혹부터 살펴보자. 당시 영상에서는 분명 성조기가 반듯하게 펼쳐져 있고 또한 펄럭펄럭 휘날렸다. 이를 두고 음모론자들은 진공 상태인 달에서 어떻게 깃발이 펼쳐지고 휘날리는 것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조기 부분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풀릴 의혹이다. 깃발의 가로 부분에 막대기를 넣어둔 것이 분명히 보인다. 애써서 달까지 갔는데 깃발이 잘 보이지 않으면 곤란하니, 일부러 위쪽에 막대기를 넣어 펼쳐지도록 만들어 둔 것이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졌던 힘이 남아서 계속 흔들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기가 펄럭였다면 이것은 달에 공기가 있다는 뜻이고, 미국 정부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 다뤄야 할 의혹이 많으니 이에 대한 긴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자. 달에 공기가 있다면 빛의 산란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였을 것이다.
두 번째 ‘뜨거운 달 표면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의혹은 어떨까. 실제로 달에는 대기가 없어 햇빛이 그대로 달 표면에 닿는다. 최고온도가 130도까지 올라가 필름이 녹아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NASA는 카메라에 고온을 견딜 특별한 보호 장치를 했고, 아폴로 우주선이 머무른 것은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였다고 해명했다.
한 때는 달 표면에 찍힌 우주인의 발자국도 논란이 됐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다. 따라서 우주인의 몸무게가 어린아이처럼 가벼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주인의 발자국이 수분도 없는 달 지표면에 너무 깊고 뚜렷이 찍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달 표면은 레골리스라고 하는 흙이 수 ㎝에서 수십m 두께로 덮여 있는데, 이것의 수분 함량은 극지방에 많아봐야 5.6% 내외로 건조한 편이다. 그렇지만 수분이 적다고 반드시 자국을 찍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밀가루, 베이비파우더 같은 건조한 가루를 생각해보라. 손에 꼭 쥐면 입자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 수분이 없어도 뭉치고, 딱딱한 물체로 누르면 자국이 생긴다.
그밖에 사진 속 우주인과 아폴로 달 탐사선의 그림자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의혹도 단골 메뉴다. 어두운 그늘이나 태양을 등진 피사체가 오히려 밝게 빛나는 까닭이 지구에서 조명을 여러 개 설치해 촬영을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달의 지형이 굴곡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달 표면은 반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달 표면의 먼지들이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시켰고 이것들이 사진 속 문제의 피사체(하필 이것들은 대부분 흰색이다)를 비추면서 그런 사진이 촬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달에서의 사진을 보면 하늘에 별빛이 없다. 간혹 이것을 지붕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별빛이 나오지 않은 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다. 달에서는 낮에도 하늘이 까맣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햇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필름을 빛에 아주 짧게 노출하기 때문에 별처럼 희미한 빛을 찍기는 어렵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틀린 주장이다. 아폴로 11호가 밴앨런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방사선이 가장 약한 경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이 왕복 여행 중에 노출된 방사선의 양은 평균 1.8mSv(밀리시버트) 정도인데 인체에 크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다.
심지어 방사선 노출이 가장 심했던 아폴로 14호 임무에서도 우주비행사들이 노출된 방사선의 양은 평균 11.4mSv였다. 당시에 NASA가 우주비행사들에게 제시한 연간 허용 피폭량이 500mSv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폴로 계획에서 노출된 방사선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이처럼 달 착륙 조작설은 ‘명성’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 기초과학 수준에서 몇 분 만에 반론을 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당시 지켜보는 눈도 많았다. NASA는 전파 감도가 더 양호한 호주 파크스천문대 측에 착륙 생중계를 일부 맡겼고, 세계 각지에서 아폴로 11호 착륙에 관심을 갖고 전파를 추적하고 있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천문대들은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설치한 레이저 반사경을 이용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다. 21세기 들어서는 여러 나라의 달 탐사 위성이 아폴로호의 착륙 흔적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우주비행사들은 지금까지 382kg이나 되는 월석을 지구로 들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속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속을 것이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인간이 강박적으로 어떤 사건에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솔직히 음모론의 스토리텔링은 매력적이다. 실제 사실과 상상 속의 사실을 잘 짜 맞춰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의미’를 만들어낸다.
‘수면자 효과’도 이유로 꼽힌다. 수면자 효과는 신뢰도가 낮은 출처에서 나온 메시지의 설득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출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메시지의 내용만 선명해지는 탓이다.
음모론을 꾸준히 확산시키는 주범은 누굴까. 최근에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공대 연구팀은 ‘지구 평면설’을 믿는 음모론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유튜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2018년 발표했다. 지구 평면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가설이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2017년부터는 ‘평평한 지구 국제 콘퍼런스(FEIC)’라는 학회도 열리고 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 지구 평면설과 관련된 영상을 본 사람들은 9·11 테러나 달 착륙과 관련된 음모론 영상도 한 편 이상 시청했다는 것이다. 유튜브가 관련 영상을 추천해준 덕분이다. 음모론을 가려내고 진실을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사회다.

관련기사






![[과기원NOW] GIST, 3D 배경 분위기 자동 생성하는 'AI 디자이너' 개발 外](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24/05/171680007852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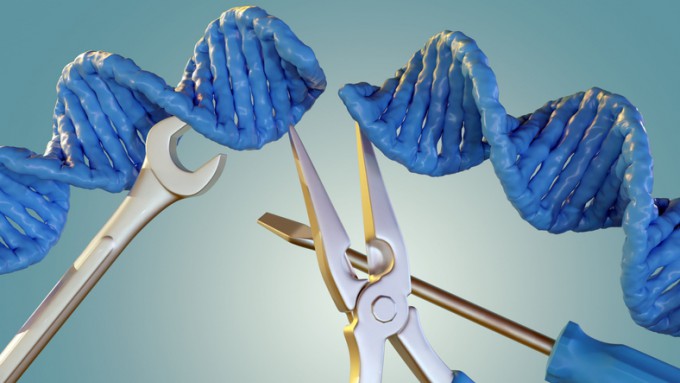


![[표지로 읽는 과학] 자폐, 양극성 장애 비밀 품은 세포·유전자 밝힌다](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24/05/171652776648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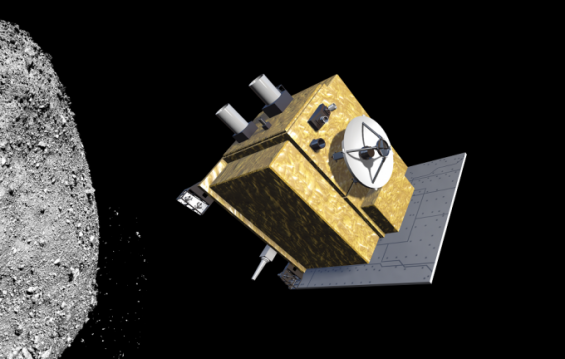















![[사이언스N사피엔스] 고대의 하늘](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19/09/1568855037590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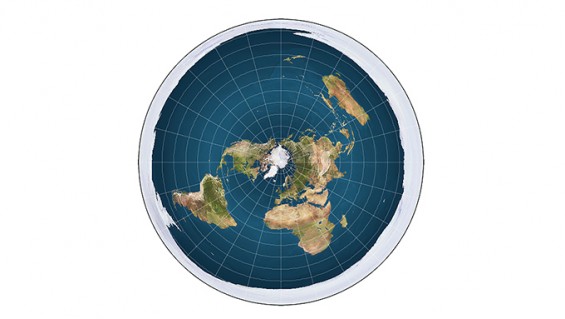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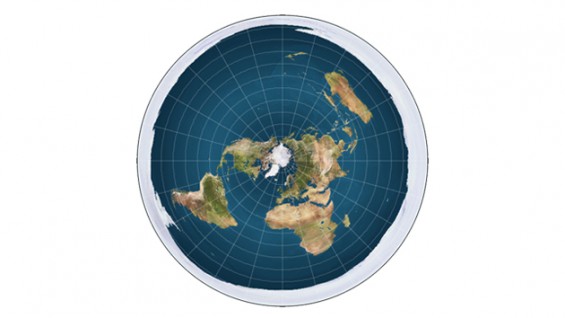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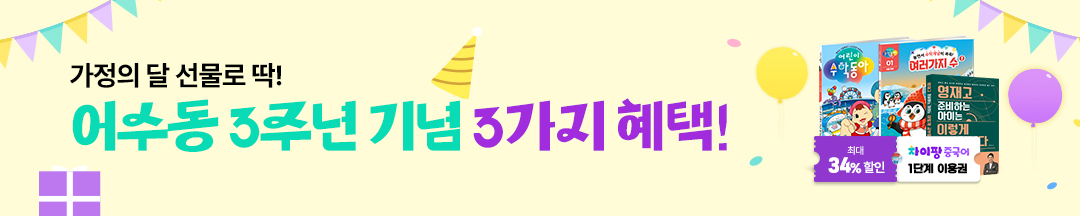

![[푸드테크 뜬다]① 배양육부터 주방로봇까지…미래 먹거리 좌우한다](https://image.dongascience.com/Photo/2024/05/17146914179862.jpg)